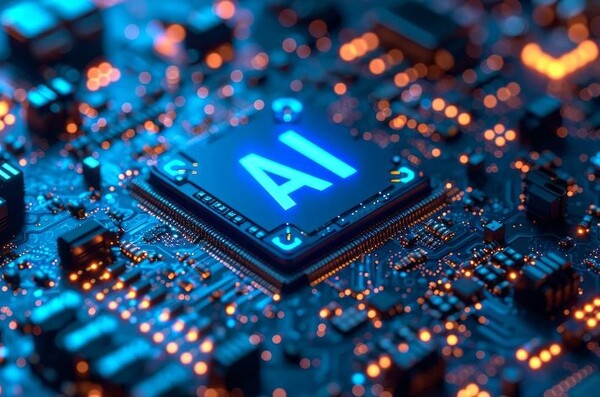
해외 의존도 높은 PCB 틈새로 부상
직수출 적어 영향 제한적…업계 “상황 예의주시 중”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계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수량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 주는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언제 세부조항이 나올지 알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도 예의주시하는 모양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8,000만달러(약 13조8,840억원)로 전체 수출 품목 중 세 번째로 비중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전 세계에 보편적 관세 10%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한국에는 25% 상호관세를 도입한다”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는 이후 “반도체 관세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반도체 산업 역시 관세 영향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국내 반도체 업계도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다만 국산 반도체가 미국으로 직수출되는 수량은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업계에 주는 영향이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재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생산한 고대역폭메모리(HBM)리는 대만 반도체 패키징 업체 TSMC 등에 보내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수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고객사가 대부분 미국과 연관된 기업들이긴 하지만 국내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직수출하는 완제품의 비중보다 패키징 전문회사인 TSMC 등에 공급돼 수출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며 “한국의 반도체 부품을 공급받는 패키징 기업 역시 미국에 공장을 구비해 둔 상태인 만큼 공급망 다변화로 관세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쇄회로기판(PCB)이 대미 반도체 수출의 틈새시장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따르면 PCB의 일반 관세율은 0%로 한국산 제품 역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PCB는 주로 반도체, 자동차 전자장비, 통신기기, 소비자 전자제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전자 산업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산 PCB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산 PCB는 2018년부터 시행된 무역법 301조로 인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이후 트럼프 제2기 행정부 출범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 2월 10%의 추가 관세가 붙었고 3월 10%의 추가 관세가 가중돼 기존 25%의 관세에 20%의 추가 관세가 더 부과된 상태다. 대규모 생산 시설과 낮은 인건비, 정부 지원 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미국 내 기업들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소비자 전자제품, 자동차, 통신 장비용 PCB의 경우,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 특성상 미국 내 제조업체보다 해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도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의 ‘메이드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이 강화될 경우, 미국산 PCB 생산 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대량 생산 및 중저가 PCB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관계자는 “미국의 첨단 PCB에 대한 수요가 크고 공급선 다변화의 움직임이 지속 중이기 때문에 한국PCB 기업들은 반도체 기판(ABF), 고밀도 회로(HDI), 고주파(RF) PCB 등 기술집약적인 제품군을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넓힐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며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제품을 공급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부과할 것이라는 세부 조항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